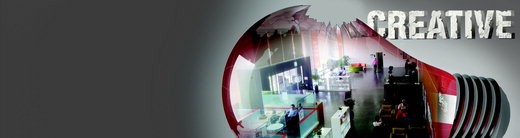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세종대로 KT 광화문사옥 1층 '드림엔터' 입구에서 만난 KT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지난 2월 개관한 후 5개월여가 흘렀지만 이곳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는 표정이다. 또 다른 KT 직원은 "오가다가 잡담을 하는 커피숍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휴게실 정도로 여겼다.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KT 직원들조차 이곳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자랑하는 '창조경제 교류공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표정이다.
정문을 통해 드림엔터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직원은 "1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793.3㎡(240평) 규모의 1층 공간은 썰렁해 보였다. 7~8명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264.4㎡(80평) 규모인 2층도 분위기는 마찬가지. 몇 사람이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이곳이 개관 이후 공간 이용자 수 1만7006명(6월 13일 기준)을 기록한 창조경제 교류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는 창조경제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내세운 창조경제는 첫돌도 지나지 않아 '안녕하지 못하다'.
최문기 장관이 이끈 '1기 미래부'가 지난 1년간 사방에서 부산하게 '삽질'을 해댔지만 건물 창조는커녕 기초공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다. 공룡 부처인 미래부가 지난해 12조원 가량의 매머드급 예산을 쓰고도 성과 창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창조경제 정책은 창조경제의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사실상 성과 없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정책도 산업 진흥과 소비자 편익 중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파편적 전략 수립에 시간을 허비했다.
통신정책의 경우 가계통신비 경감과 비정상적인 단말기 가격, 불법보조금 등 현안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규제만 강화했다. 인터넷·게임은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룰을 마련하지 못해 국내시장을 글로벌 기업의 '놀이터'로 만들었다. 과학기술 분야도 어설픈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도하다 비정상적인 부작용만 양산했다. 늑장인사는 출연연 수장 공석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를 초래했다.
■'신기루'로 끝난 창조경제정책
미래부가 지난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한 창조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신기루 좇기'로 요약할 수 있다. 손에 잡힌 게 없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인 창조경제위원회는 지난해 7월 2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5월 29일까지 아홉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크게 2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창조경제민관협의회도 2차례 회의를 열어 크게 6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들 안건은 단순 방안과 계획으로 '돈 쓰는 일'만 늘려놨을 뿐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허브로 내세운 '창조경제타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창조경제타운 방문건수는 지난해 4·4분기 27만847건이었다가 올해 2·4분기 22만2834건으로 낮아졌다. 아이디어 제안도 지난해 3·4분기 4390건이던 것이 올 2·4분기에 2477건으로 곤두박질쳤다. 아이디어가 성과로 연결된 사례도 드물다. 미래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ICT 벤처기업 수가 8307개로 전년 대비 352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 수 대비 ICT 벤처기업 수 비중은 28.5%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진흥은 없고 규제만 있는' 통신정책
창조경제를 이끌어야 할 핵심 동력인 방송통신정책은 지난 1기 내각에서 본연의 역할인 '진흥'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점철되면서 시장의 혼란과 후퇴를 야기했다는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3월 미래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다. ICT 진흥부처로 출범한 미래부는 이통 3사에 45일간의 순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규제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이통시장은 침체에 빠졌고 중견 휴대폰업체인 팬택은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유탄'을 맞아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용두사미'가 돼가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도 정책 결정을 당초 6월에서 오는 11월로 연기해 혼란만 초래했다. 12년째 겉돌던 국가안전재난통신망 사업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야 기술방식 재선정에 들어갔다. 방송 분야에서는 당장 700㎒ 주파수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상'만 키우는 과학정책
과학기술계도 미래부의 지난 1년을 비정상만 키운 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래부가 추진한 일명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으로 인해 지난 1년 과학기술계의 분위기는 위축됐다.
가뜩이나 과거 외환위기 시절 정년이 단축된 데다 연금혜택도 제공되지 않는 복지여건에서 정부의 추가 규제마저 받아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심지어 정상적인 기관마저 부패한 집단으로 몰리자 연구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미래부 산하기관장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도 정책실패 사례로 꼽힌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자리는 반년째 비어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룰 없는 인터넷·게임 정책
인터넷·게임업계는 1기 미래부에 대해 공정한 룰을 세우지 못한 대목을 문제로 지적했다. 미래부는 국내 인터넷·게임 산업에 '역차별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토종 ICT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ICT기업들은 정부의 역차별성 규제에 참다 못해 해외로 떠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이런 와중에 미래부는 국내 포털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검색광고 구분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냈다. 그 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희비는 교차했다. hwyang@fnnews.com양형욱 최갑천 박지애 김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