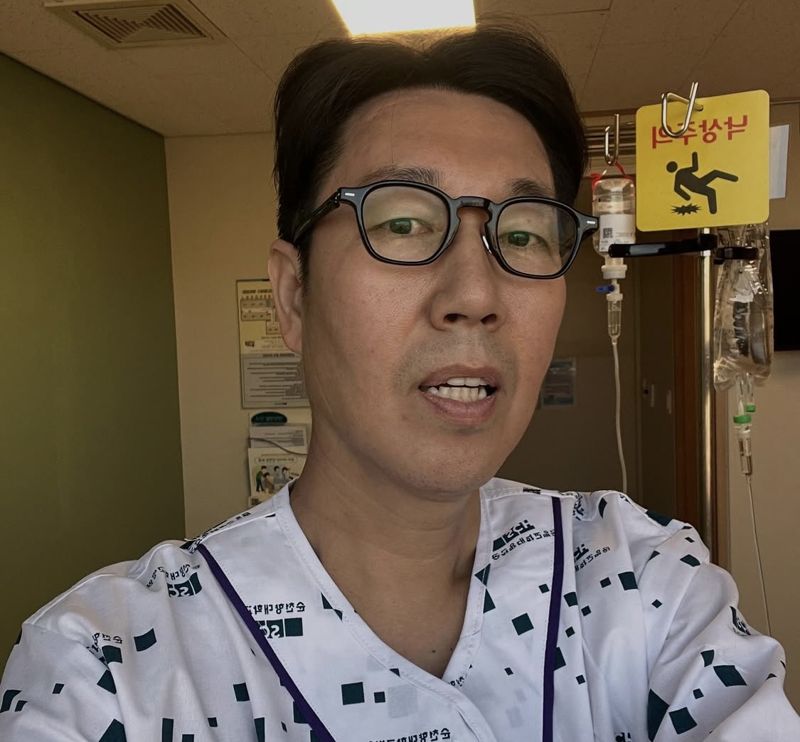젊은층은 전셋값 올라 주거불안.. 금리생활자 소득 줄어 생계불안.. '귀족연금' 수령자 자산가로 부상
![[염주영 칼럼] 저금리가 바꾼 세상](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6/02/15/201602151655074233_s.jpg)
알 수 없는 것이 경제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자주 빗나간다. 나는 저금리 시대가 오면 가진 것 없고 빚만 있는 사람들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전세금 폭탄을 터뜨리는 뇌관일 줄이야. 보통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내집 마련은 멀어진 꿈이 됐다. 전셋집이라도 장만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왜 세상이 이렇게 팍팍해졌을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금리 탓이 크다. 글로벌 경제불황은 세계 각국을 금리인하 경쟁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바람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까지 내렸다.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도 연 1%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4%대였고 일부 은행은 7%대에 후순위채를 팔았다. 불과 7~8년 사이에 은행권 금리가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이 전세시장이다. 금리가 낮아지자 집주인들은 종전과 같은 수준의 이자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전셋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월세로 바꿨다. 그 피해는 주택시장 신규 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들에게 돌아갔다. 금리가 4분의 1로 떨어지면 전셋값을 4배로 올려야 집주인이 손해가 없다. 10여년 전에 1억원대였던 서울 시내 소형아파트의 전셋값은 요즘 4억원대로 뛰었다. 신혼부부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4억원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선택 가능한 대안은 두 가지다. 신혼 초부터 수억원대의 빚을 지느냐, 아니면 월세, 그것도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다 터를 잡느냐다. 전세에서 월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집의 의미는 경제적 가치 이상이다. 젊은 세대들은 연쇄적인 계층 하향이동을 강요받고 있다.
저금리에 배신당한 사람들이 또 있다. 연금 없는 금리 생활자들이다. 지인 중에 나이가 일흔이 넘도록 자영업을 하며 한푼두푼 저축해 2억원 정도 목돈을 마련한 분이 있다. 노년에 편히 살려고 정년퇴직을 하고도 십수 년을 생활전선에서 버텼다. 이제 이만 하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먹고살 수 있으려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금리가 판을 깨버렸다. 4분의 1 토막이 난 수입으로는 용돈은커녕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은퇴한 노인세대 가운데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한쪽에 손해 본 사람이 생기면 다른 쪽엔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저금리 덕에 귀족 반열에 오른 사람들도 있다. 퇴직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 이른 바 '귀족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4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직종과 직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다. 죽을 때까지 받는 월 300만원의 현재 가치 총액은 금리와 생존기간에 따라 복잡한 셈법을 거쳐 산출된다. 단순 계산으로는 매월 그만큼의 이자소득을 얻으려면 금리가 연 6%일 때 6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리가 1.5%로 낮아지면 그 네 배인 24억원이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에 월 300만원의 연금 수령자는 집 등 다른 재산까지 포함할 경우 적어도 30억원대 이상의 자산가가 되는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인 내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던 시절을 떠올려 보곤 한다. 그때도 대학 나와 직장 잡고, 결혼하고, 집 장만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고,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으로 인식됐다. 요즘에는 그 기본을 하기가 힘겨운 세상이 됐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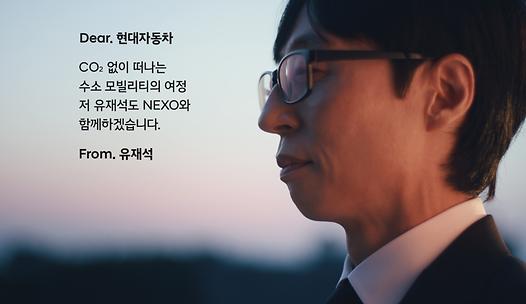





!['정현규 결별설' 성해은, 발리서 과감 호피 비키니…완벽 몸매 [N샷]](https://image.fnnews.com/resource/crop_image/2025/07/13/thumb/202507130839183816_1752370912069.jpg)
![제시, 한뼘 비키니로 파격 노출…수영장서 완벽 몸매 [N샷]](https://image.fnnews.com/resource/crop_image/2025/07/13/thumb/202507130941435244_175237092431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