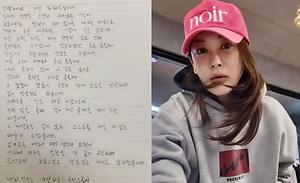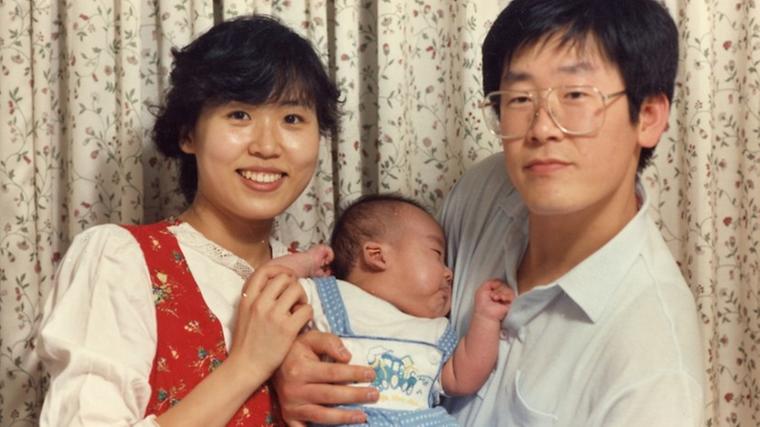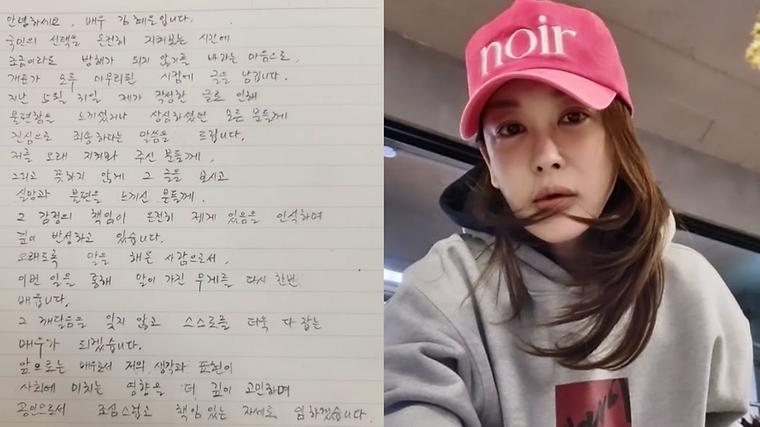![[fn논단] 내년 예산과 재정지출의 효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6/09/07/201609071723167857_s.jpg)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정부예산안을 확정지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삭감되지 않는다면 400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은 기정사실이라 할 수 있다. 정부예산이 100조원을 초과한 것은 2001년 김대중정부 때였으며 이후 각 정부마다 100조원씩 증가한 예산 규모에 도달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나라 살림살이가 400조원 규모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해온 반면 우리 경제의 성장은 부진했으므로 적자재정을 피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국가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2017년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이며 이는 2001년의 국가채무에 비해 5.6배 증가한 규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 아직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므로 보다 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이 향후 급속도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현재의 재정건전성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의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재정지출의 효과는 학문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오래된 주제이다. 재정지출을 확대해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키고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고통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의 성과는 미미한 가운데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어 경제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항상 해답은 아닌 것이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효과는 정부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부패하지 않고 효율적인 정부에서는 재정지출의 효과는 높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정부에서는 그 효과는 낮다는 것이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결론이기도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정부지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는 그 집행체계라는 것이다. 정책목표에 합당한 지출대상이 선정되었는지, 지출과정에서 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 즉 정부의 질이 정부지출의 효과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예산안 국회심의에서 재정사업의 집행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은 해당 사업의 집행체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심의 때 항상 나타나는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등 구태의연한 행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국회의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현재로는 없지만 20대 국회가 이전 국회와는 달리 성숙한 양식을 지녔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안해 본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