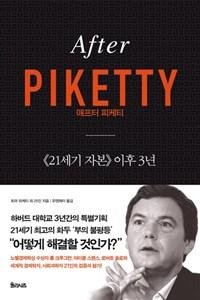
애프터 피케티/토마 피케티 외/율리시즈
‘부의 불평등’은 가장 뜨거운 화두다. 크레디트스위스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글로벌 부(富)’ 보고서에 따르면 최상위 1%인 이른바 ‘슈퍼리치’들은 전세계의 부의 절반인 50.1%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부의 편중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부의 불평등을 가중시킨 셈이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일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최근 경제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책이다. 전세계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 출간돼 200만권이 넘는 판매부수를 기록한 이 책은 불평등과 경제를 본격적으로 다뤘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화두로 각종 논란을 일으킨 이 책이 불평등과 경제를 다룬 방식과 분석은 정확했을까. ‘21세기 자본’이 나온지 3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피케티는 과연 옳았는가. ‘애프터 피케티’(율리시즈 펴냄)는 이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하버드대학 출판부는 21개 분야의 전문가 25명을 찾아 피케티 이후의 세계를 전방위로 조망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 책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을 비롯해 로버트 솔로, 마이클 스펜서 등 각 분야 최고의 경제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피케티가 던져놓은 화두와 씨름한 결과가 담겼다.
우선 알아야할 것은 하버드대가 ‘애프터 피케티’라는 책을 낼 정도로 왜 피케티에 주목하는지다. 하버드대 출판부는 서문에서 “노동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공약에도 힐러리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와 달리 젊은 유권자와 역사적으로 낮은 고용율을 기록해온 소수 인종들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피케티의 분석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함께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우리는 이 책이 요즘과 같은 시기에 특히 더 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피케티는 이 책으로 경제학계의 ‘록 스타’로 단숨에 떠오를 정도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불평등’이라는 전제 하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지를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뿌리채 흔들어버릴 수 있는 주제로, 특히 지난해 말 미 대선 이후 피케티의 확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주요 배경이다.
그렇다면 토마 피케티는 과연 옳았을까. 찬성과 반론으로 나뉜 학계에도 불평등의 심화라는 사회적 현상과 함께 여전히 피케티는 검증을 받고 있다. 이 책도 ‘피케티는 옳은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만큼 불평등이 중요한가’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사실 피케티가 제시한 ‘부의 불평등’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에 방점이 찍힌다. 어떤 문제로 ‘부의 불평등’이 만들어졌다는 점보다는 50년, 어쩌면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읽어야할 부분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 어디로 향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여기에 달렸다.
피케티 현상을 다루며 시작한 이 책은 그의 이론적 토대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제2차 도금시대(1945년 이후)에 들어선 지금 이윤 추구가 최대 목적인 자본주의는 부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피케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피케티 이론을 두고 부의 분배, 소득 비율 등 불평등에 대한 모든 영역의 찬반론과 그 검증이 실렸다. 마지막에는 피케티의 해명과 답변, 보충설명으로 마무리된다. 다만 피케티는 그가 책에서 설명한 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현재의 상황이 비록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다같이 힘을 합쳐 운명을 개척해갈 수 있다고 본다.
피케티는 이 모든 현상을 미국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의 책이 국내에서도 화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미국의 현실이 우리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