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티빙, 파라마운트플러스와 '연합전선'
각자 플랫폼에 파트너관 신설 방식 전망
상호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도
각자 방식으로 글로벌 공략 '준비운동'
각자 플랫폼에 파트너관 신설 방식 전망
상호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도
각자 방식으로 글로벌 공략 '준비운동'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라마운트글로벌의 OTT '파라마운트플러스'가 오는 6월 국내에 출시된다. 파라마운트플러스의 아시아 진출은 한국이 처음이다.
파라마운트플러스는 티빙 내 전용관을 만드는 '플랫폼 내 플랫폼' 방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CJ ENM 관계자는 "파라마운트가 갖고 있는 방대한 양의 영화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티빙이 갖고 있지 않던 콘텐츠 영역 등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콘텐츠의 장르와 범위가 다양화되고 콘텐츠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티빙 내 파라마운트플러스 전용관 신설과 더불어 파라마운트플러스 내 티빙 전용관 신설 등이 티빙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사의 현지 플랫폼에 콘텐츠 노출해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있게 다가가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이익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시장에 진출은 그 나라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도전"이라며 "티빙과 파라마운트는 각자 목표 시장 공략에 성공하기 위해 협업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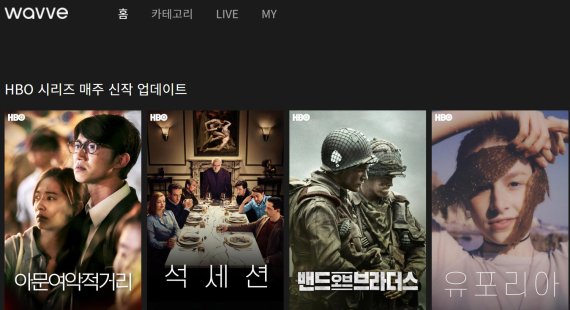

티빙 외 다른 토종 OTT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글로벌 OTT 시장 공략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콘텐츠를 수급하거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다. 토종 OTT들은 향후 글로벌 진출에 대한 대략적인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다.
웨이브(wavve)는 출범 직후부터 해외 시리즈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HBO 콘텐츠 수급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지난해까지 HBO, NBC유니버설, CBS 드라마 등 누적 해외 타이틀 400개 이상, 에피소드 3700편 이상을 플랫폼에 들인 바 있다.
웨이브는 올해에도 신작 해외 시리즈 수급을 이어가는 한편,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질 좋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질 좋은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라면서 "현재는 좋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쌓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왓챠도 지난 2017년부터 국내에선 생소한 해외 콘텐츠 '왕좌의 게임' 등을 앞장서 공급해 왔다. 아울러 같은해 국내 OTT 중에선 처음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일본 소비자 취향을 분석, 이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에는 플랫폼에서 동영상 외 웹툰, 음악 등까지 제공하는 '왓챠 2.0'을 추진하는 한편, 연내 해외 진출 국가를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OTT들이 각자만의 색깔과 주요 이용자 특성에 맞춰 글로벌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있다"며 "각자 가진 강점이 다른 만큼 접근 방식도 상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