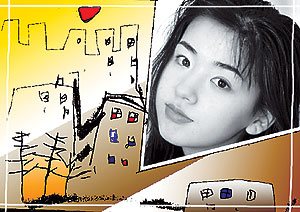
이스탄불로 가는 밤 비행기 안에서 강선우는 웅철이 놈과 그동안 보류해 왔던 비밀스런 이야기의 잠금쇠를 푼다.
병실에서 이승과 마지막 하직을 고하며, 문제의 얼기설기한 누런 봉투를 강선우에게 인계했던 구문배의 충격적인 유언.
한데도 웅철이 놈은 별반 놀란 기색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 웅철이 놈이 전혀 생소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어렴풋이가 아니다. 거의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야 옳다.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도리어 머쓱해진 강선우가 묻는다.
“뭘?”
“네 할아버지가 터키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나보구 튀기라고 놀렸을 때.”
“그랬었니? 정말 아이들이 튀기라고 널 놀렸었니?”
“얘들은 구튀기라고도 했고, 혼혈아라고도 했어. 하지만 그때는 튀기가 뭔지 몰랐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놀려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하긴, 넌 어렸을 때 놀림을 당한다는 말 누구한테도 한 적 없었으니까.”
“삼촌, 왜 내가 축구 선수가 된 줄 알아? 튀기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랬어. 정말 학교 대표선수가 되니까 애들은 날 놀리지 않았어. 그렇지만 내가 미국 튀기가 아니라 터키 튀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였어.”
“그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잖아?… 그렇지만 니네 아버지도 너한테 한번도 그 얘길 꺼낸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가 말해주지 않았지만, 난 다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냐구?”
웅철이 녀석이 회심의 미소를 살짝 머금으며 말을 잇는다.
“터키에서 온 편지를 뜯어보고도 알았지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며 베개 밑에 넣고 자곤했던 그 봉투를 몰래 꺼내봤거든. 아버지가 그 쪽으로 보낸 편지도 읽었고, 할머니와 외국 장교랑 찍은 사진도 봤고… 한눈에 그 잘생긴 장교가 내 할아버지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었어.”
“아,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 때 왔던 큰아버지 구문호씨한테 얄망스럽게 굴었구나?”
“그건 아냐.”
웅철이 놈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그건 절대로 아냐,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순진한 줄 알고 너무 많이 괴롭혔어. 형이라는 핑계로 만날 피해만 줬어. 그래서 싫어했던 거야.”
“그랬었구나. 그건 그렇다 치고, 왜 알았으면서 한마디도 내색하지 않았니?”
“그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나는 나니까.”
뭐랄까, 나름대로 출생의 비밀에 대한 관심의 척도가 유별나지 않다고나 할까. 강선우가 생각해도 녀석은 확실히 괴짜다.
예컨대, 부(富)에 관한 개념이 그러하다. 아니 어쩌면 부에 대해 운운하는 그 자체가 녀석에게는 난센스일지도 모른다.
하긴 녀석이 김은희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능히 짐작이 가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로 무감각 하리라고는 강선우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터다.
생각해 보라. 한국 재벌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판수의 외동딸이 웅철이 놈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상 더 완벽한 따놓은 당상이 어디 있으며, 아무리 아이큐 낮은 저능아라 하더라도 그 천운의 기회를 제발로 차내는 바보가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한단 말인가.
물론 웅철이 놈이 김은희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터부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놈이 그 기회를 십분 활용한다면, 어떻게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미적미적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
여느 야망에 똘똘뭉친 젊은이 같으면, 김은희 모시기를 상전중의 상전으로, 혹은 제 능력으로 안되면 불가불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이른바 확실한 도장을 찍고 말았을 터다.
/백시종 작 박수룡 그림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