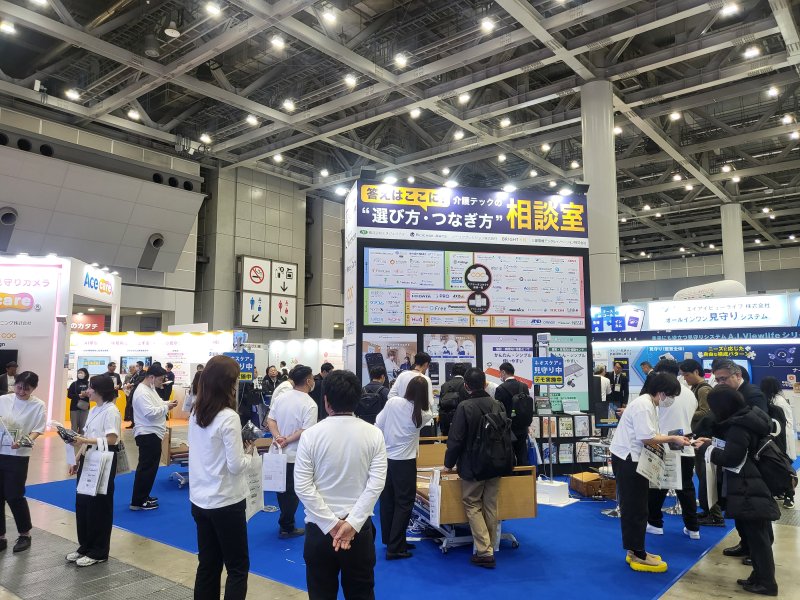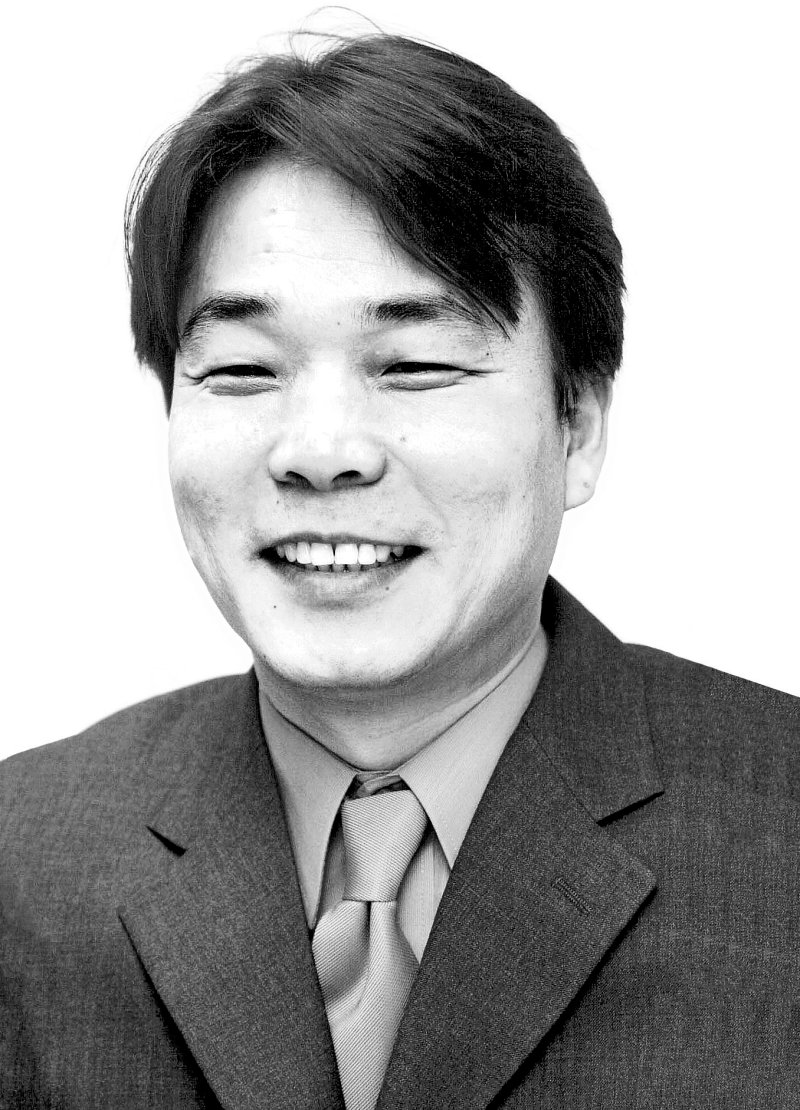fn사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배가 다닐 수 없게 봉쇄됨으로써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중동 지역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자동차부품, 기계류 등이다. 중동은 최근 우리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지역으로, 농수산물과 식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가 문제다. 시장조사기관인 번스타인은 아시아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동 지역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을 한국과 일본,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데 도요타의 시장점유율이 17%로 가장 높다. 현대차는 10%, 중국 체리(치루이·奇瑞) 자동차가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란 내 자동차 판매 감소, 중동 차량 운송과 공급망 차질, 유가 상승에 따른 자동차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자동차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중동 시장 자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각국의 수출 타격은 세계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만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중동을 경유하는 유럽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웃 나라 중국이나 일본의 수출 감소와 관광 부진, 그에 따른 경기침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반도체 산업 활황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높였다. 여전히 높지 않은 성장률이기는 하지만 최근 몇년간의 저성장 기조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중동전이 한달 이상 장기화하면 이 전망치도 낮춰질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만약 150달러까지 올라 과거의 '오일쇼크'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8%p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씨티 연구진은 82달러대를 유지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45%p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현재 중동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악화하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향후 파업에 불참하는 직원들을 우선 해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파업이 확정될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명단을 별도 관리해 추후 노조와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배나 해고가 진행될 때 불참자들을 1순위로 올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는 단체행동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업 역시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 역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가 파업을 독려할 수는 있어도 불참자를 낙인 찍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노동권의 취지는 집단의 힘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되 개인의 선택 역시 존중하는 데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임금과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대표적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상한 폐지 여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기존 상한을 유지한 채 산정방식을 일부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실적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제도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쟁의권 확보와 총파업 준비에 나섰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으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 기업의 실적 자체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성과에 안주할 상황은 아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 등 핵심 분야에서는 경쟁사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고, 기술 경쟁 역시 한층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