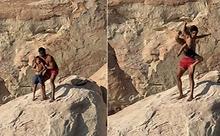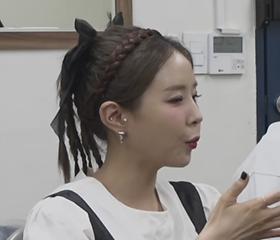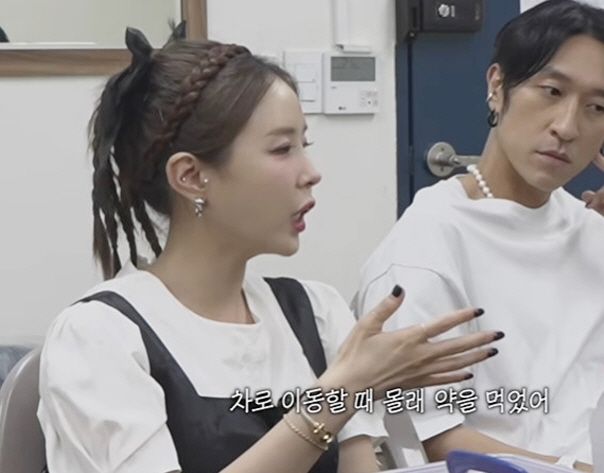이런 모순이 또 있을까. 고등학교에서 문과는 6대 4의 비율로 이과보다 많다. 대학 정원은 인문.사회.교육계열이 48%, 공학.자연과학계열(의.약학 포함)이 38% 수준이다.
기업은 수요에 따라 인력을 충원할 뿐이다. 기업더러 굳이 필요없는 인문학 전공자들을 더 뽑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인력 공급원인 대학이 우리 기업·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대학이 직업 양성소냐는 비판부터 인문학 교수들의 고용 유지라는 실제적인 문제까지 걸림돌로 작용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청년실업을 고려할 때 문·이과 비율 조정에 대한 반발은 사치로 보인다. 상아탑의 고상한 이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게 아니라면 수요·공급상의 미스매치, 즉 불균형을 속히 바로잡는 게 옳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 역시 대학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장차 고등학교에 문·이과 통합과정을 도입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동시에 계발하기 위해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 1학년이 되는 2018년부터 새 과정이 적용된다. 이들은 오는 2020년 수능을 문·이과 구분 없이 치르게 된다. 고교 교육이 통섭형으로 바뀌면 대학 커리큘럼에도 상응하는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통섭형 인재가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전까진 아직 10년 이상 남았다. 그 전에 인문학을 보는 기업의 시각도 달라졌으면 좋겠다.
21세기에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으나 서체학(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과목을 청강했다.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꾼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그때 서체학을 청강하지 않았더라면 맥컴퓨터의 다양한 서체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고교 시절 뛰어난 수학실력 못지않게 '일리아드' 등 그리스 고전에 심취했다. 대학(하버드)에선 컴퓨터공학과 심리학을 배웠다. 선도자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모방꾼은 그 뒤를 따른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인문학적 소양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