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외교관 성화수가 전하는 내일은 마다가스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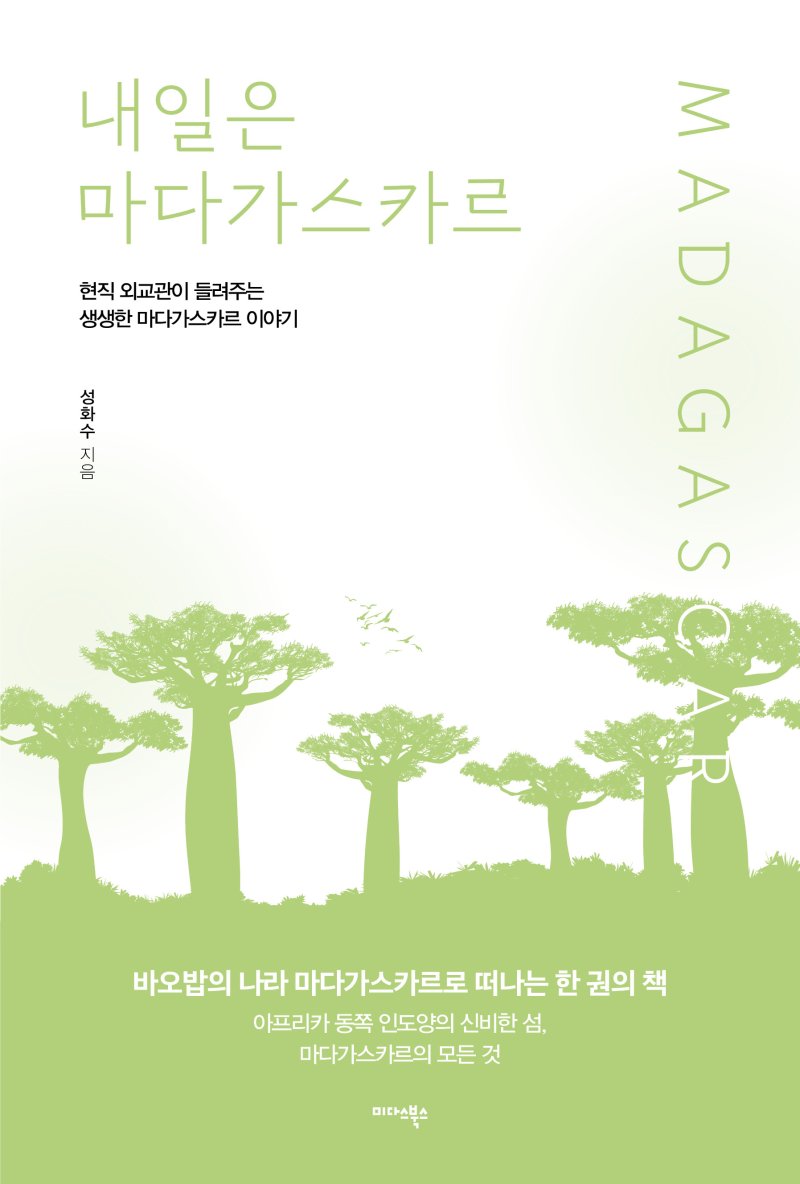
대화 도중, 그는 형제 10명과 함께 했던 따뜻한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고향을 물어봤을 때, 그는 "마다가스카르"라고 답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한 달 전, 본부로부터 마다가스카르 대사관 개설 요원으로 부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점이었다. 그때 당시 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본부 복귀를 선택했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이틀 뒤 외교부 아프리카과 차석으로 발령받은 첫날 내게 주어진 임무는 마다가스카르 외교 장관의 방한 일정을 챙기는 일이었다. 마다가스카르 외 교 장관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마다가스카르에 부임해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갔다. 그 후, 캐나다 대사관에서도 마다가스카르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고 어느새 마다가스카르는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2020년 여름,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나는 마다가스카르 대사관에 부임하기로 결심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다. 마다가스카르 국경이 폐쇄된 상황이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몬트리올, 파리, 에티오피아까지 민간 항공편을 이용했다.
하지만 아디스아바바에서는 민간 항공편이 없어, 긴급하게 세계식량계획 WFP의 구호기를 타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한 뒤, 다시 마다가스카르로 향했다. 무려 1박5일에 걸친 여정 끝에 마침내 마다가스카르 땅을 밟았다. 작고 소박한 국제 공항을 나서자 푸른 하늘과 맞닿은 듯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내 시야를 채웠다. 마치 낙원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었다.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이례적으로 마다가스카르에서 4년을 보내며 그곳의 자연과 사람들,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다.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 아름다운 섬이 대한민국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음 다짐했던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글을 쓰기로 결심하고 남은 시간 동안 자료를 모으며 집필을 이어갔다. 그리고 '내일은 마다가스카르'를 펴내게 됐다.
나는 오늘도 마다가스카르를 꿈꾼다. 생마르탱섬의 투명한 바닷가 풍경도, 수도 타나의 분주한 거리도 잊을 수가 없다. 길거리에서 커피를 흰 통에 담아 팔던 사람들, 맨발에 반바지 하나만 걸치고 인력거를 끌던 이들, 슬리퍼를 걸치고 먼지 날리는 공터에서 공을 차던 아이들, 논둑 위에 형형색색의 옷을 널어 말리던 아낙네들까지 모두 그립다. 언젠가 이 나라에도 고속도로가 깔리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며, 신호등과 육교가 세워지는 날이 올까? 비록 가난하지만, 너무도 순수한 말라가시인들과 끝없이 푸른 하늘,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더 많은 사람이 알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풀어낸다.
성화수 외교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