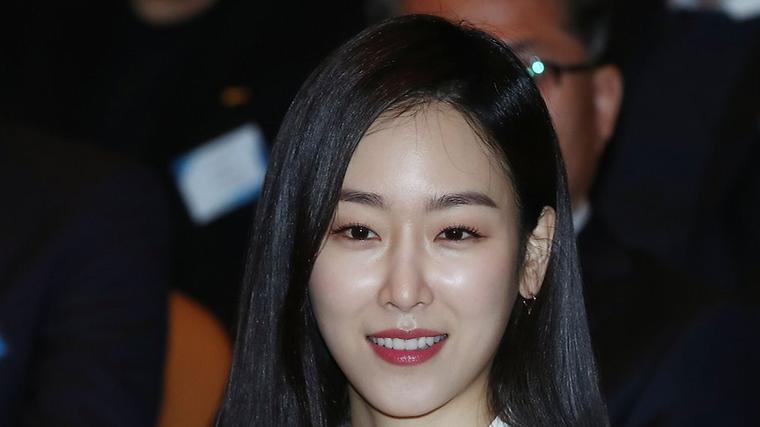여러 협회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내놓고 있지만 숨죽이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금융권이다. 특히 조 단위의 수익을 내는 은행은 예대마진을 키우면서 손쉬운 이자장사로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적발표 때마다 눈총을 받는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은행은 소상공인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며 은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은행들은 '상생금융'이라는 포장지로 그해 3·4분기까지 번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할당된 소상공인 지원금 약 2조원을 풀어야 했다.
보험사, 카드사도 상생금융에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했다. 은행이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 내는 보도자료마저 금융상품보다 사회공헌활동 소개가 많아진 것은 기자의 기분 탓이 아니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의 취임 일성에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가장 앞에 놓여 있는 시대다. 시장의 자율경쟁을 우선시하는 보수 정부에도 호되게 당한 금융권이 차기 정부를 뽑는 대선을 앞두고 고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장기화된 내수침체에 수출악화로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문제는 금융을 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다. 규제 리스크, 정치 리스크는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매번 지목된다.
이 같은 지적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겨울 한밤의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한국 금융시장의 신뢰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피해 자율배상 과정에서 은행은 금융당국의 조사와 결정에 따라 막대한 피해금액을 보상했다. 한 은행장은 이사회에서 외국인 사외이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KB금융그룹은 한국에서는 리딩금융이지만 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가 올해 발표한 '세계 100대 은행'에서 68위에 그쳤다. 10위권에는 중국공상은행,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 등 중국, 미국, 일본 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금융사를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든 장본인은 한국 정치권과 정부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에 금융시장 발전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 한국산업은행을 서울에 둘지, 부산으로 옮길지 해묵은 이슈를 두고 기싸움이 한창이다. 산은이 부산으로 가면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나. 금융시장에 대한 공부부터 필요해 보인다.
gogosing@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