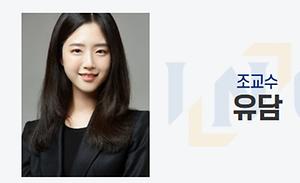[편집자주]관광에서 '먹거리'는 빼놓을 수 없다. '먹방투어' 등 최근 지역 먹거리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제주의 먹거리'는 풍요로운 바다와 들판에서 나오는 다양하면서도 신선하고 청정한 식재료와 '섬'이라는 특성이 담겨 타 지역에는 없는 특별한 맛과 풍미가 있다. 제주도가 선정한 '제주 7대 향토음식'의 유래와 변천과정 등을 7회에 걸쳐 소개한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제주 바다에는 '자리돔'이 지천이다.
도미과에 속하는 '자리돔'. 자리돔의 '자리'는 '한자리에 모여 산다'라고 해서 지어졌다고 한다. 이 설에 이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자리돔은 회류성 어종이 아니라 여(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에서 태어나면 그 자리에 정착한다.
어떤 자료에는 자리돔은 5월부터 8월까지 잡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금은 어획술이 발달해 가을과 겨울에도 잡힌다고 한다.
자리돔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기 때문에 자리돔을 '잡는다'고 하지 않고 '뜬다'고 한다. 혹은 '자리 거리러 간다'고도 말하는데 이는 그물로 잡아 올린다는 말이다. '거리다'는 그물로 잡아 올린다는 제주말이다.
지금이야 엔진이 있는 어선들이 나가 잡아 오지만, 그 시절 동네 청년 몇몇이 '테우'(통나무 몇 개를 엮어서 만든 떼배)를 타고 가서도 잡아 올 정도로 흔한 어종이다. 자리돔을 잡아다 동네에 인심 쓰는 것은 당연했다.
자리돔으로는 크게 자리회(물회), 자리구이, 자리젓 등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었다.
이 중 자리물회를 으뜸으로 친다.
싱싱한 자리돔을 뼈째 썰어 채소와 함께 막된장으로 양념한 후 시원한 물을 부어 먹는다. 제피나무의 잎을 약간 넣으면 향도 좋고 비린내도 가신다. 제주 사람들은 여기에 더 톡 쏘는 빙초산을 한 방울 떨어뜨려 먹는다. 제주 사람들은 자리물회에 보리밥을 말아서 먹었다고 한다.
제주의 식생활은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제주사람들이 여름에 즐겨찾는 '자리물회' 역시 이 같은 섬 문화의 결정체다.
지금은 별미 향토음식으로 손 꼽히지만 '자리물회'는 누구하나 넉넉하지 않던 시절 먹을 것이 마땅치 않던 제주사람들의 구황식이었다.
자리돔은 기름기가 적어 소화가 잘 된다. 또 뼈째로 먹기 때문에 칼슘과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고단백질이라 성장기 아이들이나 환자에게도 좋다.
자리돔과 관련해 '자리 먹은 노인은 허리 굽은 사람이 없다'거나 '한여름 자리물회를 다섯 번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다.
제주에서 '자리돔'을 놓고 마을끼리 경쟁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제주 서귀포시 '보목'자리와 '모슬포자리다.
'원조' 다툼을 벌일 정도로 '자리돔 부심'이 강하지만 두 지역에서 잡히는 자리는 특색이 다르다. 보목자리는 뼈와 가시가 연하고 크기가 작아 물회나 강회로 먹는 것이 좋고, 모슬포자리는 크기가 크고 뼈가 강해 구이용에 적합하다는게 정설이다.
이는 바다가 잔잔한 지역(보목)과 조류가 거센 지역(모슬포)의 차이라고 한다.
자리물회는 관광객에게 '호' '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음식이기도 하다.
자리물회를 처음 대하는 관광객들은 "뭐 이런 음식이 있느냐?"며 놀라기도 한다. 자리돔의 칙칙한 색이며 메주된장을 듬뿍 넣은 모양새도 별로다. 더러는 아예 맛도 못보고 일어서기도 한다.
하지만 꽤나 이름이 알려진 유명식당에서 자리물회를 찾는 손님도 적지 않다. 열에 셋 정도는 관광객이다. 한 번 그 맛을 알면 제주에 올때마다 꼭 맛을 본다고 한다.
최근에는 관광지 주변 식당가 등에서 육지 관광객 입맛에 맞춰 된장 대신 고추장으로 양념한 붉은 자리물회도 간혹 선보이기도 한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